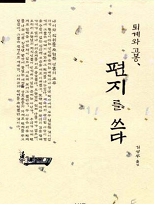
퇴계와 고봉-편지를 쓰다, 옮긴이 김영두, 소나무출판사
우리의 기억 속에 구조화된 “논쟁”의 의미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논쟁의 결과가 유쾌했던 기억이 희박한데 기인한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서울역 회군파와 진군파 사이의 논쟁으로 하여, NL과 PD 사이의 논쟁, 개량이냐 혁명이냐, 민주 정부 수립이냐 민중 정부 수립이냐, 의료계 내부에서는 민족 보건론, 민중 보건론……등, 그 논쟁의 결과는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깐 각자의 길을 가자”였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길로 걸어갔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의 투쟁에 앞서 논쟁에 지쳐, 일상으로 돌아갔다.
개인적으로도 학교 선배들과의 논쟁의 결과로 고향을 등지고 말았다. 돌이켜 보면 선배나 나나 별반 차이 없는 인간들이었지만, 선배는 후배에게는 질 수 없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나는 그들이 현실에 적응하면서 정당화 하는 모습이 이해되지가 않았던 것이었다. (사실 내가 학생시절 듣기 싫었던 말이- “내가 너 만할 때 다 그렇게 했다.”-였다. 나이가 자기 주장의 정당화 가장 큰 논거였던 셈이다. 결국 그런 말을 하던 인간들은 그만할 때 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하지 않는다.)
우리가 옛사람의 글과 책을 읽는 이유는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기 보다는 진리와 역사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배우는데 있다하겠다. 지식은 인식의 한계가 넓어질수록 따라 넓어지고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는 가변적인 요소라면 세상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 책 또한 “四端七情論”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과 지식보다도 이황과 기대승 사이에 오고간 편지 속의 인간적인 면과 학자로서 학문적 이견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 온다.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 가진 기존 관념 중에 하나가 바로 삼강오륜 (三綱五倫)중의 하나인 장유유서(長幼有序)이다. 그러나 이 책 속의 대화에서는, 기성세대와 신진세력간의 갈등의 해결을 위해 내세운 장유유서의 질서를 지키기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로서 평등한 태도가 나타난다. 조선시대 중기부터 시작한 주기론과 주리론과의 헤게모니 싸움의 분수령이 되었던 이 논쟁이, 실제로는 서로의 영혼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배려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아이러니하다.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할 때 이황은 쉰여덟의 나이로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 서울대학교 총장인 성균관 대사성이었으며, 기대승은 서른둘의 나이로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한 청년이었다. 퇴계 이황은 주리론을 완성하여 조선의 주자로 추앙받는 인물이며, 기대승은 출세하기 위해 학문을 닦는 학자가 아니라 삶은 진리를 터득하려고 한 청년 학자였다.
이야기의 시작은 고봉이 과거에 합격을 하고 난 뒤, 서울에서 고향으로 떠나는 퇴계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때 고봉이 보낸 글에 대한 답장으로 퇴계는 “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줄이고, 오직 이 시대를 위해 더욱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을 남긴다.
사단 칠정론의 논쟁이 시작된 퇴계의 편지
그대의 (사단칠정론에 관한) 논박을 듣고 나서 더욱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고쳐 보았습니다. ‘사단의 발현은 순수한 이인 까닭에 언제나 선하고 칠정의 발현은 기와 겸하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승의 답신
그렇게 고친다면 비록 지난번의 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제 의견으로는 그래도 불만스럽습니다.…무릇 이는 기의 주재자요, 기는 이의 재료입니다. 이들은 본래 구분이 있지만, 실제 사물에서는 완전히 섞여서 나눌 수 없습니다.…모름지기 이는 기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가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스스로 발현된 것이 이의 본래 모습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타난 퇴계는 진리에 대한 이견 조정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 관직 생활의 어려움과 세상살이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조언을 주고 있다. 또한 자신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조심스럽게 후학들에게 의견을 묻는 겸손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기성세대로서 후학들에 대한 배려인 동시에 학문의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자의 태도라고 하겠다.
이에 반해 후학인 고봉은 자신의 학설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시 巨儒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자신의 학설에 대해 치밀하게 논거를 준비하고 연구를 한다. 또한 퇴계의 학설을 일부 수용하여, 자신만의 “사단칠정론”을 완성을 하게 된다. 고봉의 강점은 신진세력으로서 기존의 권위를 수용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주목하는 모습도 바로 이점이다. 우리가 행했던 수많은 “논쟁의 추억”들이 불쾌했던 것 이유는, 우리가 진실로 진정한 해답을 원했기 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했기 때문이다. 나는 개량이 아니고 혁명주의자이고, 나는 NL이 아니고 PD이며, 나는 남성중심주의자가 아닌 여성해방주의자이고….. 등등, 우리가 규정했던 “논쟁”의 본질은 진리나 해답을 나아가기 위한 방법의 모색보다는 우리의 뒤늦은 정체성 발견의 강조, 그 이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러한 논쟁들은 대개 관성의 힘이 부족했다. 퇴계와 고봉이 무려 하나의 합의점을 얻기 위해 13년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눈 것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상투적인 말로 갈라지며, 헤어졌던가? 이는 모두 우리가 논쟁을 하는데 있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시대를 위해 자신을 소중히 하라”라는 말의 전제 함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향해가는 길, 역사와 함께하는 길에 있어 선배나 후배나 모두 같이 가는 동지라는 생각, 그러한 이해 속에서 서로간의 배려와 이끌어줌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특집] 산재사망은 왜 기업의 살인인가](http://laborhealth.or.kr/2019/wp-content/themes/Extra/images/post-format-thumb-text.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