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야기
노동법, 자본의 협력자로 탄생하다
유성규 /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
산업혁명기 생산성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인류사회는 잔혹한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인간 존엄성의 무게가 달라지는 사회. 동물 사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동족간 포식 구조가 횡행하는 사회. 무한대로 확대된 계약 자유와 경쟁의 원칙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삶의 질서를 한순간에 집어삼켰다.
변화된 현실 앞에 인류는 무력하였다. 어린 아이들과 임산부가 탄광에서 석탄가루를 들이마시고 가쁜 숨을 내쉬고 있을 때, 다른 한켠에서는 풍족에 겨워 돈으로 담배를 말아 피우는 풍경이 연출되었다. 노동자들에게 삶은 생존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고, 그 끝은 처참하였다.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겼더라도 미처 어른이 되기도 전에 공장과 탄광에서 죽어갔다. 상황이 이에 이르니, 자본주의 사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노동력 재생산이 위기에 봉착했다. 상품을 구매할 소비자들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에 이르니, 자본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절실해졌다.
이렇게 노동법은 탄생되었다. 노동법은 자본과 노동의 적절한 타협책이었다.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노동력 재생산과 안정적 상품 소비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영국에서는 최초의 공장법이라 할 수 있는 ‘도제의 보건 및 도덕에 관한 법률(The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이 1802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면사 및 양모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약 40년이 흐른 뒤,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장노동법(The Act to Amend the Law Relating to Labor in Factories)이 제정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사실은 성인 남성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훨씬 뒤에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 노사관계의 특징인 ‘노사자치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국가가 임금, 근로조건 등 노사간 문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노사자치의 전통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1799년과 1800년 노동자단결법(Combination of Workmen Act)은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었다. 노동조합의 법인격과 활동이 제대로 보장된 것은 1871년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이 제정된 이후의 일이다.
독일은 영국보다 산업 발전이 늦었다. 이 때문에 노동법도 늦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재의 독일 노동법은 노동자경영참여와 단결권 보장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독일 노동법의 시작은 비스마르크가 제정한 질병보험법(1883년), 공업재해보험법(1884년) 등 사회보험법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노동법이 국가의 권위와 기업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입법을 반대하였으나, 사회보험법제의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다. 비스마르크가 제정한 사회보험법들은 1911년 제정된 제국보험법(Reichsversicherungsordnung)으로 통합되어, 독일 현대 사회보험법제의 기초가 되었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은 1891년 공업조례령 제7편이 만들어진 이후 본격화되었다. 그 이후 1902년 선원령, 1903년 아동보험법, 1911년 가내노동법, 1914년 상업에 있어서의 경쟁제한법 등이 계속적으로 제정되었다. 독일에서도 애초에는 노동자들의 단결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1918년 바이마르(Weimar) 헌법에 의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 단체협약이 헌법으로 보장되었고, 근로자위원회와 경제위원회의 제도적 기초가 만들어졌다. 독일 노동법의 중요한 특징은 노동자의 경영참여이다. 이와 관련하여, 1920년 경영협의회법은 노동자대표 및 대표기관의 설치, 경영 사안에 대한 협의권을 인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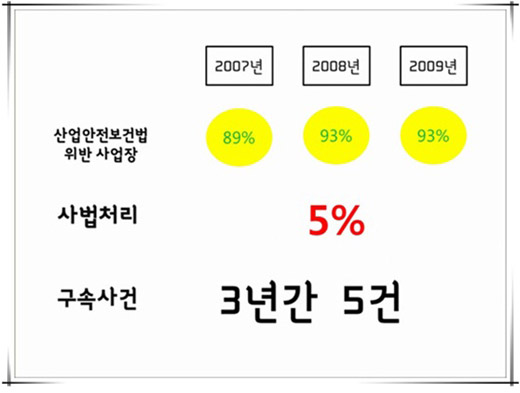
자본의 필요성에 의해 탄생했다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은 서구에서 노동자들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었고, 경제 위기 시에는 일자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었다. 때로는 노동자의 정치 참여를 위한 행보에서 견실한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법은 노동자의 정치 참여와 결합되어 진화를 거듭하며 발전하였고,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었다.
혹자는 이 같은 역사를 근거로 노동법의 강화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중대한 판단 착오이다. 노동법은 애초부터 노동자들의 것이 아니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적 유지, 운영을 위해 고안된 수단에 불과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지, 노동자들을 겨냥한 창날이 될지는 자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 중요한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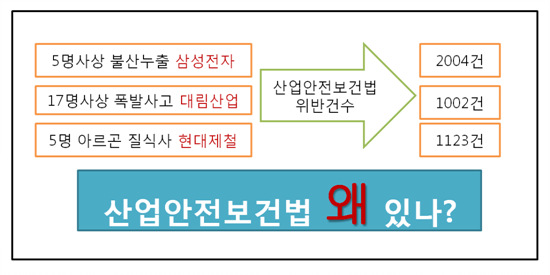
실제로, 자본이 위기에 봉착하자 시장과 경쟁의 원리가 또 다시 세상을 잠식해가고 있다. 당연히, 노동법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 방패가 아닌 창날의 모습으로 노동자들 앞에 나타나고 있다. 가까이 우리나라를 살펴보자.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들어 버린 파견제도 노동법의 작품이고, 하루하루 연명하다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고되어야 하는 현실도 노동법의 작품이다. 노동자들을 대한문 앞으로, 철탑 위로 내몬 정리해고 역시 노동법의 작품이다.
전 세계를 휩쓰는 신자유주의 광풍 앞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야생 사자가 동물원에 갇혀 사냥의 본능을 잃어버리듯, 그 동안 노동자들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단결’과 ‘조직’의 본능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노동법은 노동자들이 깃발과 머리띠를 찾기도 전에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했고, 어느 순간 노동자들은 이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노동법의 두 얼굴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자본이 노동법을 이해하듯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먼 옛날 선배 노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단일한 깃발을 세우고 하나의 목소리를 외치는 날. 법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의 주체로 우뚝 서게 되는 날.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곁에 서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