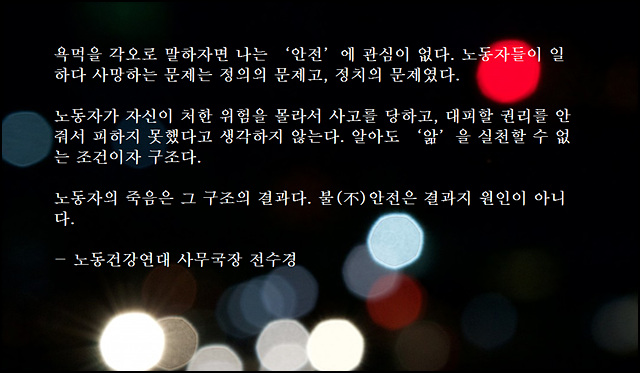그 사람의 죽음, 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월요일 아침 울산에 내려왔다. 현대중공업 ‘일산문’ 앞에 두 대의 차가 서 있다. 한
대의 봉고차에는 “4대 요구안 쟁취, 원청 현대중공업 교섭촉구,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 “하청노동자의 죽음 앞에 현대중공업은 사죄하고 노동 3권 보장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다른 한 대의 1톤 트럭 위에는 농성장이 차려져 있다. 하청노동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목에서 농성하는 이들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들의 동료 10명이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지만, 기업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하청노조와의 교섭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책임지는 이 하나 없다는 현실이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이들이 지난해 한 해 갑자기 위험해진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죽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다치는 사고들은 물밑에서 은폐됐다. 창사 이래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망이 켜켜이 쌓여 있었을까. 피에 톱밥을 뿌려 놓고 다시 일했다는, 옆에서 누가 죽어도 2시간 만에 일을 시켰다는 그곳이었다.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런 일은 무심하게 계속됐다. 2012년 12월 어느 날 한 노동자가 트럭에 실려 응급실로 갔고, 결국 사망했다. 심근경색이었다. 노동자들을 인터뷰해 보면 당시만 해도 다친 노동자를 트럭으로 운반하는 일이 흔했다고 한다. 짐짝 그 자체였던 거다. 추적 60분에서 다뤄진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남아 있다. 2013~2014년 울산 건강권대책위원회·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산재 은폐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250여건의 은폐를 밝혀냈다. 그래도 그뿐이다. 6만명이 넘는 현대중공업을 담당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이 한 명이라는 슬픈 현실이 앞에 놓여 있다. 산재를 은폐하는 것은 범죄지만, 이 사회는 범죄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렇게 작은 사고들이 가려지고, 고쳐지지 않아 큰 사고가 뻥뻥 터진다. 사람이 죽는다. 신기하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발전하고 잘살게 됐다는데.
2013년 5월 당진 현대제철에서는 5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얼마 전 그 사건의 책임자였던 부사장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다. 1심에서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을 시킨다고 했다. 판결문을 읽다 보니 이상했다. 이러다가 2심이 되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었다. 2심 법원에 탄원서를 보냈다. 집행유예는 안 된다고,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결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집행유예였다. 그 판결 결과를 받으면서 동시에 현대제철의 다른 사망에 대한 고발 결과도 나왔다. ‘혐의 없음’이었다.
살인과 산재 사망은 뭐가 다를까. 어느 정도 안전장치와 안전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일을 시키는 기업, 안전예산은 뒷전인 기업, 같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연속된 산재사망, 어쩌면 예견된 죽음이다. 경향성도 뚜렷하다. 대기업은 위험한 일은 전부 하청을 준다. 사고가 나면 반드시 하청노동자가 희생된다. 그 대기업 앞마당에는 무재해 깃발이 휘날린다. 꼭 흉기를 휘둘러야 살인인가.
한 해에 2천명 정도가 일을 하다 죽는다. 꿰어 맞춘 듯 2천명 선으로 고정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망률 1·2위를 다툰다. 사망자는 전 세계 최고치인데, 다친 사람의 통계는 매우 낮다. 한국에서 10명 죽는 동안 1명만 죽는 영국보다 다친 사람이 적다. 마법 수준의 통계다. 외국 연구자들은 반드시 한 번씩 물어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게 말이다. 상담이 오면 사람들은 “제가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 신청하면 해고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부터 한다고 답해 준다. 스스로 가리고 묻어 버린 아픔이 이따금 더 큰 슬픔이 돼 돌아온다.
2015년은 어떻게 바뀔까 생각하기도 전에 연말과 연초를 아울러 큰 사고가 앞다퉈 터졌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질소가스에 질식해 하청노동자가 죽었는데 LG디스플레이에서 보란 듯 같은 이유로 하청노동자가 죽었다.
현대제철이 생각난다. 또 높은 사람은, 원청회사는 책임지지 않게 되는 건가. 이것부터 궁금하다. 2014년은 되돌아보기도 버거울 정도로 큰 상처였는데, 보듬고 정비할 여유도 주지 않는다. 후퇴하고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그러다 보니 유독 대체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걸까, 궁금해진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88

![[한겨레 2/11][왜냐면] 한국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http://laborhealth.or.kr/2019/wp-content/themes/Extra/images/post-format-thumb-text.svg)
![프레시안] 민주노총,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http://laborhealth.or.kr/2019/wp-content/uploads/2019/07/art_150578596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