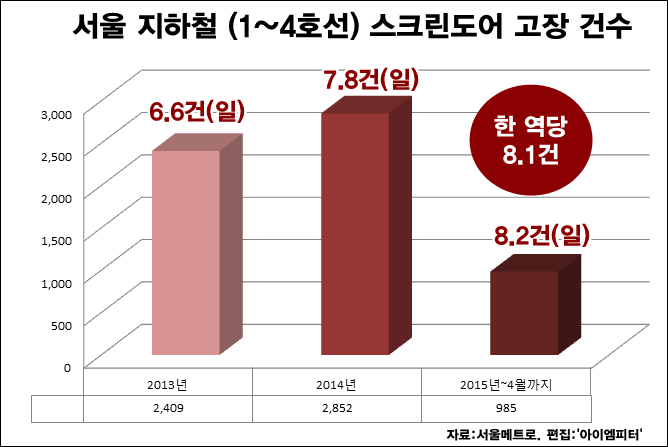[한겨레21][내 곁에 산재] 신데렐라의 구두 만들다가 뒤틀려버린 손가락
전수경 활동가
서울 성동구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내리니 지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고층 빌딩이 줄지어 있다. 점심시간 지하철역 주변은 분주하다. 사무직이나 정보기술(IT) 업종에서 볼 수 있는 캐주얼한 옷차림의 직장인들이 식당으로, 카페로 무리 지어 오간다.
그 뒷길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 30년 넘게 수제화를 만들어온 박완규씨를 성수역 3번 출구 앞에서 만났다. 새로 지은 빌딩을 뒤로하고 구두를 만드는 공장까지 뒷길로 걸었다. 오래되고 낮은 상가건물들, 간판 없는 건물들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 마당과 인도 구분 없이 오가는 지게차들이 도시 안쪽에 노동 현장이 있음을 말해준다.
잠을 줄여야 제값 받는 구조
박씨를 따라 3층짜리 상가 건물로 들어갔다. 공장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따라 철제 선반에 발처럼 생긴 플라스틱 모형들이 진열됐다. 작업장 안에선 검은 가죽 원단부터 앵클부츠 완제품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잠시 작업 멈춰보세요, 선배님들. 세라 전무랑 대표랑 만났어요. 얘기 다 됐고요, 2천원 공임은 이번주부터 원래대로 들어올 거예요.” 재봉틀 소리, 망치 소리가 멈췄다. 고요해진 제화작업장 안에서 박완규씨가 소리 높여 소식을 전한다. “수고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십수 명의 ‘선배님들’이 박씨에게 인사를 건네는 동시에 재봉틀과 망치가 일제히 다시 움직인다.
“2천원 공임 얘기가 뭐냐 하면, 아웃렛에 들어가는 구두 가격을 내리느라 본사에서 하청에 단가를 낮춰서 물량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청업체가 제화노동자들 공임을 2천원씩 깎았더라고요. 한 켤레에 7천원 받던 걸 5천원 주는 거죠. 대신에 일감을 많이 준다고 했대요. 한 달 동안 이걸 모르고 있다가 지난주에 알았어요.”
세라는 탠디, 소다, 미소페와 함께 백화점에 입점한 대표적인 제화 브랜드다. 제화 브랜드들은 구두 디자인과 가격 등을 정해 하청업체를 통해 구두를 제작한다. 하청업체는 한 브랜드의 일감만 받고 제화노동자들은 한 하청업체에만 출근해서 구두를 만든다. 박씨가 세라 전무와 대표를 만나서 공임을 원래대로 받아낸 것은 제화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으로 그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박씨는 2020년부터 구두 만드는 일을 잠시 접고 전국민주일반노조 제화지부 지부장 일을 맡고 있다. 50대를 갓 넘긴 박씨는 60대 선배님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노동조합 일을 맡았다.
박씨는 10대 후반에 제화 기술을 배워 30년 동안 구두를 만들었다. “엘칸토, 에스콰이아, 금강이 있고 여기서 브랑누아, 해피워크, 미스미스터, 레스모아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수제화가 대중화되면서 일감도 많아졌어요.” 성수동에서 한창 구두를 만들 때 웬만한 구두 브랜드들이 다 박씨 손을 거쳐갔다. “지금은 탠디, 소다, 미소페, 세라죠. 그때도 지금도 직영공장을 가진 곳은 없어요. 다 하청에서 하는 거예요.” 하청업체는 제화노동자에게 월급제가 아닌 ‘개수제’(만든 개수에 따라)로 임금을 준다. 잠을 줄여가며 구두를 만드는 만큼 공임이 늘어난다. 30년 동안 근로기준법도, 4대 보험도, 퇴직금도 적용받지 못한 이유다.
“새벽 6시 버스 타고 출근하면 (제화작업장에) 다 와서 앉아 있어요. 와서 막차 탈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손목이랑 손가락뼈가 다 뒤틀려 있죠. 손가락 마디가 안 돌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손이 곧 연장인 제화노동자들의 손가락 마디는 망치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구두를 만드는 일은 한 짝씩 구두를 끌어안고 가죽을 오리고 붙이고 두드리면서 완성하기다. 가죽 원단을 자르는 일도 가죽을 붙이는 일도 정교해야 한다. 맨손으로 한다. 본드는 구두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접착제다. 창문이 열려 있지 않은 작업장은 본드 냄새로 가득하다.
“우리는 (작업장 환경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죠. 본드 냄새 난다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온몸을 웅크린 채 일해야 하고, 본드에서 나오는 벤젠·톨루엔 같은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노동법이 정한 건강검진을 받은 적도 없다. “시간이 없죠.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개수제로 월급을 받으니. 식당에서 밥이 오면 뒤돌아 앉아서 먹고, 다시 뒤돌아 서면 작업하고.”
50대에 ‘막내’ 노동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제화노동자들은 대응할 새도 없이 법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됐다. 견습부터 도제 과정을 거쳐 숙련공이 되기까지 한 공장에서 유대감을 쌓으며 구두를 배우고 가르치던 제화노동자에게 하청업체 사장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내밀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길 요구하면서 하청업체와 싸웠다. 그러다가 등 떠밀려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 제화 브랜드들은 구두를 납품받아서 백화점에 진열하면 그만이었다.
2018년 봄, 제화노동자 수십 명이 퇴직금 적용, 공임 인상, 소사장제 폐지를 요구하며 제화 브랜드 탠디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했다. 하룻밤이면 나올 줄 알고 들어간 농성이 길어지면서 나이 많은 ‘선배노동자’들이 쓰러졌다. “몰랐죠, 그렇게까지 안 좋은 줄은. (농성 시작하고) 3명이나 119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혈압약, 당뇨약을 하루치만 갖고 왔는데 농성하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제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불공정하다는 생각은 있었죠. 일하는 만큼 받지 못하고.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일한 만큼 대우받아야 하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 지금도 같은 걸 요구하고 있네요.” 노동의 대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던 청년은 50살이 돼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세라 구두를 만드는 일은 세라가 주는 일감을 받아서 세라가 정한 단가대로 공임을 받는 일인데 왜 노동자가 아니란 말인가. ‘소사장’ 제화공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랐지만, 일터와 고용관계는 바뀌지 않았다.
“을하고 을이 싸우는 거죠. 브랜드 원청들은 퇴직금, 근로기준법 적용되면 철수해버리겠죠. 정부는 왜 제화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하나 적용 못할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7개국(G7) 이러면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된 노동자들은 IMF 때도 지금도 구두 한 켤레에 5천~7천원의 공임을 받는다. 30만원에 팔려도 50만원에 팔려도 구두 한 켤레에 노동자 몫은 같다. 인건비가 싼 중국, 동남아에서 온 신발이 넘쳐난다. 기술을 배우러 오는 발길이 끊긴 지 오래다. “오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제가 막내예요. 서서히 소멸하는 거죠. 더 나이 들기 전에 새 일을 찾아야 한다고 경비로, 건설 현장으로 간 선배도 많아요.”
구두 뒤에 존재하는 사람들
오래전에 성수동 제화노동자들이 만든 포스터가 있었다. ‘신데렐라의 구두는 누가 만들었을까?’ 제화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싸웠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로기준법·고용보험·산재보험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신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죠. 우리가 만든 신발, 가격이 얼마다 비교할 기준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신발은 의식주 중 하나잖아요.”

![[한겨레21][내 곁에 산재] 신데렐라의 구두 만들다가 뒤틀려버린 손가락](http://laborhealth.or.kr/2019/wp-content/uploads/2021/12/20211206_030900-1200x640.jpg)